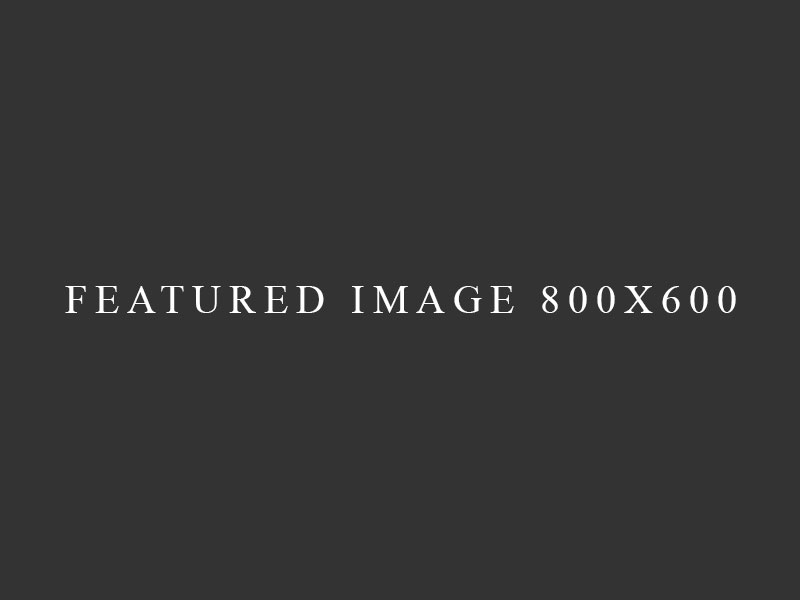2020. 김승희 공예가 작가노트
나의 지난 50년간의 작업 여정은 전통공예 기법을 바탕하여서, 우리의 뿌리 찾기, 그리고 새로운 시각적 표현과 실험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된다..
1970년 미국 유학 초기 나의 금속공예 수업내용은 힘든 노동의 과정이었다.
금속공예가 어떤 것인지 뚜렷하게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미국 공예 잡지에서 본 작품에 매료되어서 선택한 분야였기에,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내 손에 쥐여준 무거운 망치의 나는 경악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던 서울의 신당동 대장간에서 흔히 보아왔던 작업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꿈꾸어 왔던 미국의 금속공예는 훨씬 우아하고 깨끗한 작업이었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에 고민하고 갈등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는 망치 작업은 차츰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외로운 유학 생활 중 금속과 대화로써 창작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금속공예 인생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한국 전통금속공예를 접하고, 배워가면서 흥미롭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박물관과, 전통기능 보유자를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직접 기법을 연습한 후 나의 새로운 작품에 그 기법을 응용하여서 발표하였다.
70,80년대 나는 생활용품인 그릇 만들기에 열중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 시절 고급스러운 은기가 상류 부유층과 문화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용으로 혹은 혼례용, 손님 접대용으로 수요가 있었기에 한동안 나를 바쁘게 만들었다. 나는 ‘조선의 민예’(최순우 저) 책에 빠져서 민예품의 아름다움과 조형성을 재구성하여서 은기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여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평론가들로부터 한국미의 특징인 ‘구수하고 큰 맛’(고유섭) ‘무작위의 작위’(김원룡) 등 극찬을 받았다.
1987년 개인전을 통하여서 나는 대전환의 새로운 작품을 발표한다. 쓸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릇의 개념으로 그릇의 모습이지만, 설치 입체 조형물 시리즈를 발표한 것이다. 미술계가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고)이 경성 관장님께서 ‘공예의 영역을 벗어난 현대 조형’이라는 평가를 해주시고 석주미술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나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였다. 이 전시 이후 나는 표현의 자유 날개를 단 듯이 입체, 평면 등 오가면서 작은 장신구부터 대형 벽면 작업(10*2.5m)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 작품에는 일관된 나의 관심과 추구하는 조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공예 기법과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형성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내 작품의 일관된 조형은 ‘정물’ ‘풍경’이라는 단어로 함축된다.
그릇, 잎사귀, 나뭇가지 들판 같은 익숙한 형태들은 기하학적 구, 육면체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면서 새로움으로 닦아선다.
금속표면의 거친 선묘적 스크래치, 수많은 금속봉의 어울림들은 움직이는 갈대, 바람의 흔적같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살아있는 시각 예술인 것이다.
2000년대에 평론가들과 애호가들은 ‘금속으로 그린 풍경’이라는 타이틀을 내 작품에 부쳐주었다. ‘정적인 정물과 율동적 자연이 어우러진 詩的 단상’(장 동광 2006) ‘김승희의 풍경 시리즈들은 작가의 마음과 정서로 여과된 지극히 내밀적 풍경이다. 그의 풍경에서 정물과도 같은 은밀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거기에는 시공을 초월한 공간이 있으며 작가의 따듯한 정서가 배어있다’. (이 일 1995)
평론가들의 글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은 ‘시공을 초월한 공간’이다.
나는 옛날 장인들의 작업을 보면서 동감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늘 느끼고 있었으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을 초월한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
2020.01 김승희 씀
| 제목 |
|---|
내밀적 시정의 풍경 -미술평론가 이일
|
물질과 정신을 통합시킨 서정세계 -미술평론가 박래경
|
2020. 김승희 공예가 작가노트
|